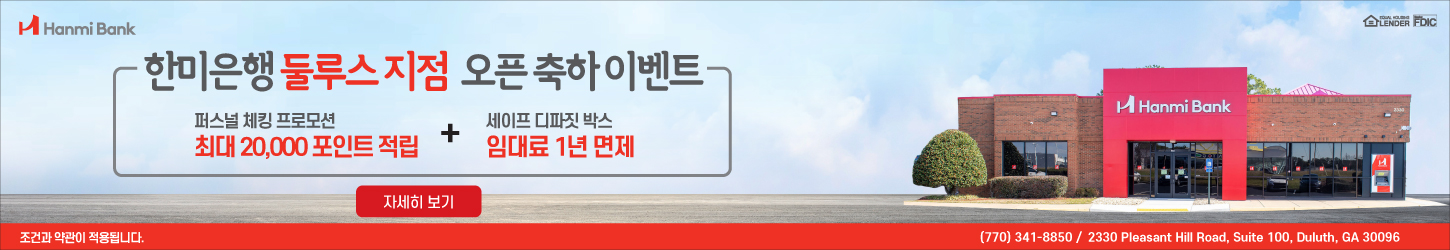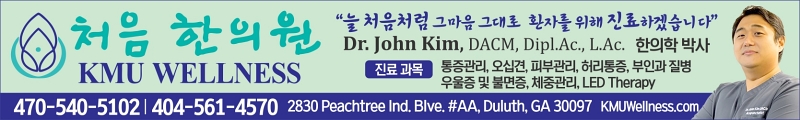대장부란 천하의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시속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뜻을 이룬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비굴하지 않은 사람이다. 소소한 이익과 명예에 연연하는 것은 필부의 삶이다. 그러한 삶이 하찮다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모름지기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사익을 버리고 올곧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품격을 지녀야 한다.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없애리라/남아 20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누가 후세에 대장부라 부르리오.” 남이 장군의 ‘북정가'(北征歌) 는 그의 호탕한 기개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는 28세에 유자광의 모함으로 역도로 몰려 참혹한 죽임을 당한다. 안중근의 ‘장부가’는 또 어떤가. “장부가 세상에 처함이여/그 뜻이 크도다/때가 영웅을 지음이여/영웅이 때를 지으리로다/천하를 바라봄이여/어느날에 일을 이룰 것인가.” 이런 각오로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에 총을 쏘았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중국 뤼순 형무소. 안중근은 형장으로 끌려갔다. 교수대 앞에는 일본인 검찰관, 통역관, 의사, 변호사가 좌정했다. “1910년 2월 14일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됐고, 명령에 따라 사형을 집행한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안중근 의사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나의 행위는 동양 평화를 위해서다. 한일 양국 국민이 서로 일치협력하고 평화를 도모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교수대에서 동양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 안중근은 3분 정도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간수가 두 장의 종이를 접어 눈을 가리고 그 위에 하얀 헝겊을 감았다. 오전 10시 4분 밧줄이 목에 걸렸다. 순간 안중근의 몸이 공중에 매달렸다. 10시 15분 검시관은 절명을 확인했다.
형무소측은 안중근과 함께 거사에 참여해 수감돼 있던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를 불렀다. 그들은 안 의사의 유해를 향해 조선 관습대로 두 번 절을 올렸다. 공판과정에서 가장 냉정했던 우덕순이 “아이고” 통곡하면서 관 위에 쓰러졌다. 간수들이 떼어놓을 때까지 그들은 관을 잡고 울었다. 차가운 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안 의사는 사형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았다.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니 당당하게 속히 하느님 앞으로 가라”는 당부를 한복 수의와 함께 전했다.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다.
순국 5분 전, 안 의사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을 담당했던 간수 치바 도시치 상등병이었다. 그는 안 의사에게 사형 집행을 알리러 갔다. 안 의사가 “다 읽지 못한 책이 있으니 시간을 달라”며 5분 남짓 조용히 독서를 했다. 31세 사형수와 25세 간수의 마지막 대화는 이렇다. “그간 보여준 친절을 마음속 깊이 고맙게 생각하오. 동양에 평화가 다시 찾아와 두 나라 사이에 우호관계가 회복될 때 다시 태어나 반갑게 만나세.” “선생님,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죄송한 마음에 가슴이 저립니다. 앞으로 선한 일본인이 되도록 생을 바쳐 정진하겠습니다.” 안 의사는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듯 지필묵을 청했다. 그리고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휘호를 써주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니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의미였다.
1909년 10월 26일, 안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 의사는 뤼순 감옥에 수감됐다. 당시 치바 도시치는 형무소를 지키던 말단 헌병이었다. 치바에게 안중근을 특별감시하라는 임무가 떨어졌다. 안 의사가 수감된 바로 옆방이 치바의 방이 되었다. 그의 인생을 바꾼 144일간의 짧은 운명적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다. 치바 도시치는 처음에는 일본의 영웅을 살해한 안 의사에게 적개심을 보였다.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권총을 겨누기까지 했다. 그러나 안 의사 거사의 대의명분과 동양평화 철학, 재판과정에서도 꺾이지 않는 지조와 당당한 태도, 인간적 품위를 접하면서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안 의사를 증오하다가 동정했고, 동정하다가 존경했고, 존경하다가 흠모했고, 흠모하다가 숭배했다.
안 의사가 처형되자 치바는 곧바로 제대를 자청하고, 고향 미야기현 센다이로 돌아왔다. 그리고 철도원과 경찰로 일하며 4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여년간 그의 삶은 안 의사와 떨어질 수가 없었다. 집안에 불단을 만들어 안 의사의 위패와 유물을 모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절을 하며 기렸다. 숨지기 직전엔 안 의사 유묵을 가보로 삼고, 아침저녁으로 위패를 모시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의 아내 치바 기치요는 1965년 74세로 죽을 때까지 30여년간 위패를 모셨고, 이는 자식으로까지 이어졌다. 치바 도시치의 후손은 1980년 안중근 탄생 100주년을 맞아 70년간 보관해온 유물을 한국 정부에 반환했다.
비상계엄 여파로 많은 별들이 떨어졌다. 격동의 세월에 누구인들 마음이 편할까만 국민은 장군들의 판단과 처신을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그들의 낙성(落星)도 안타깝지만 그들의 사라지는 모습이 더 안쓰럽다. 어떻게 딴 별인데…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그 황당한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묻지도 않는 군사기밀까지 손짓발짓 해가면서 술술 자백하는 그 모습을 보노라면 ‘어쩌다 우리 군이 이 지경이 되었나, 이런 장군들에게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안위를 맡길 수 있을까’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
장군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해야 한다. 정치 권력 앞에서 힘없이 무너진 장군의 위상을 보면서 어느 원로 장군의 탄식이 떠오른다. “우리나라에 55만 대군은 있는데 군인이 없고 ,스타는 널렸는데 장군이 없어요.!” 민병돈(전 육사교장) 장군의 일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