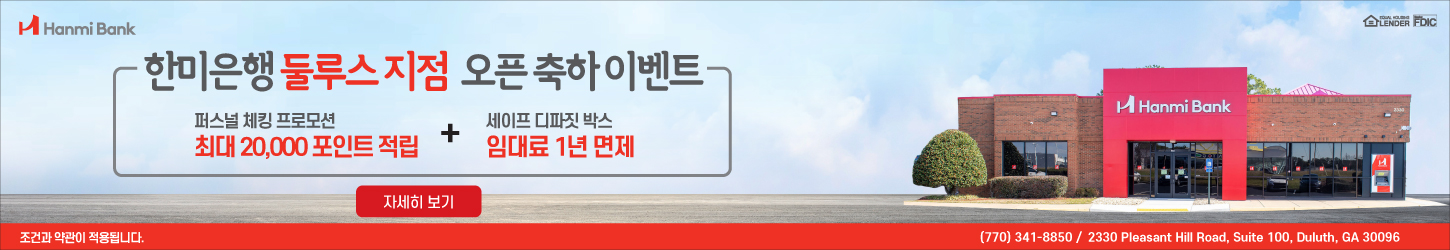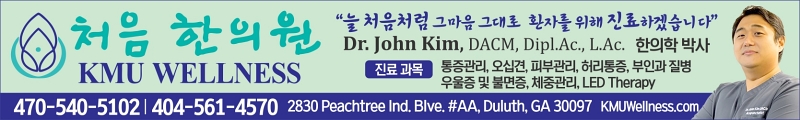신문을 읽다가 눈길이 닿은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제목은 ‘소 팔러 가는 길’. 옛 사진 한 장이 뿜어내는 세월의 빛깔이 정겹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녘 사람들이 소를 앞세워 내를 건너고 있다. 짐을 짊어지지 않은 몸, 가벼운 소를 보니 마을 건너편 우시장에 소 팔러 가는 길인 모양이다. 앞장서서 소의 고삐를 잡은 아이는 송아지일 때부터 정성껏 꼴 베고 여물 먹여 키운 정 때문에 굳이 아버지를 따라 나섰을 것이다. 다시 소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테니 오늘은 정든 소와 이별하는 날이다.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소를 팔 때는 대개 집안에 혼사가 있거나 아니면 논 한 마지기를 더 장만하려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을 때이다. 오늘은 이웃집 아저씨도 소를 팔러 함께 길을 나섰다. 그 뒤로 소걸음에 맞추려 자전거에서 내려서 천천히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까지, 다리 위 행렬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다.
소는 오랜 역사 속 깊은 인연으로 우리네와 삶을 함께 일구었던 동물이다. 묵묵히 밭을 갈고 짐을 날랐던 소는 실한 일꾼이었고, 집안 제일의 재산이었다. 어른들이 새벽이면 가마솥 가득히 쇠죽을 끓여 소에게 뜨끈한 아침 식사를 차려낸 것은 소를 단순한 가축이 아닌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소를 한 가족처럼 생각했기에 그 배려 또한 각별했다. 날씨가 추워지면 짚으로 짠 덕석을 입혀주고, 봄이 오면 외양간부터 먼저 깨끗이 치웠으며, 겨울이 올 때까지 보름마다 청소를 해주었다. 이슬 묻은 풀은 먹이지 않았으며, 늘 털을 솔로 빗겨줘 가지런히 했고, 먼 길을 갈 때는 짚으로 짠 소신까지 신겨주었다.
흔히 소는 말이 없어도 여덟 가지 덕이 있다.고 한다. 소의 덕목으로 자주 인용되는 사자성어가 있다. 우생마사(牛生馬死.). 간단히 말하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뜻이다. 얕은 물에 말과 소를 빠뜨리면 모두 헤엄쳐 육지로 올라온다. 말은 힘이 있어서 훨씬 빨리 헤엄쳐 나온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장마로 불어난 강물에 빠지면 소는 살아서 나오는데 말은 빠져 죽는다. 말은 강한 물살에 밀려가지 않으려고 열심히 헤엄친다. 아무리 힘이 센 말이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힘이 빠져 익사한다. 그와 반대로 소는 절대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물살을 따라 헤엄치면서 천천히 떠내려간다. 물결에 몸을 맡기며 떠내려가다가 얕은 물가에 닿게 된다. 사람도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 아닐까 싶다.
조선시대 초기 황희 정승의 언덕(言德)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황희가 벼슬하기 전 이야기다. 어느 날 황희가 길을 가다가 잠시 쉬게 되었다. 마침 그때 어느 농부가 두 마리의 소 등에다 멍에를 씌워 밭 가는 것을 보고, 황희가 물었다. “두 마리 소 중에서 어느 소가 더 나은가?”그 농부는 대답은 하지 않고서 계속 밭 갈기를 하였다. 그리고 밭 갈기를 그치고 나서야 황희 정승에게 다가와서는 귀에다 대고 나직이 말했다. “저 누렁소가 이 검은소보다 낫습니다”황희 정승이 괴이하게 여겨 그 이유를 농부에게 물었다. “왜 귀에다 대고 말하는가!” 농부가 말했다. “비록 가축이지만 그 마음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소가 나으면 이 소는 못 한 것이니 소에게 이를 듣게 하면 어찌 불평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후 황희 정승은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다시는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황희가 오늘날까지 훌륭한 정승으로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춘원 이광수는 소의 우직함에 반해서인지 유난히 소에 대해 애정어린 글을 많이 썼다. “소는 동물 중의 부처요 성자다…아마 소는 사람이 동물성을 잃어버리고 신성에 달하기 위하여 가장 본받을 선생”이라며 소를 예찬한 ‘우덕송(牛德頌)’이 대표적이다. 인간과 동물이 서로 통할 수 있을까.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를 보면 인간과 동물은 언어라는 장벽만 있을 뿐 찐하게 통한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늙은 소에게 먹일 청정 꼴을 베기 위해 산 중턱까지 오르는 늙은 농부의 마음. 그리고 곧 죽을 것 같으면서도 늙은 농부가 탄 수레를 이끌며 천천히 움직이고, 늙은 농부가 잠들어도 집을 알아서 찾아오는 늙은 소의 마음. 늙은 소는 “소시장에 내다 팔 것”이라는 주인의 말에 여물도 먹지 않고 눈물을 떨군다. 늙은 농부의 눈에도 눈물이 어린다.
소의 눈은 아이의 눈망울에 닿아있다. 두레박으로 길어올리는 우물물처럼 깊고, 까만 눈동자가 청아하다. 그 안에 거짓이 없다. 보는 이의 티를 깨닫게 해준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도 소는 별다른 경계심이나 저항감 없이 두 눈만 껌벅거린다. 소의 커다란 눈은 무언가 말하고 있는 듯한데 인간에겐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소에게서는 세상을 살면서 다 받아들이고, 다 이해한듯한 달관을 보게 된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네 뜻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듯한 순한 눈을 가지고 있다. 소는 느려터진 걸음이지만 제 갈 길 다 간다. 느릿느릿한데도 제 할 일 다 한다. 죽어서도 머리부터 발끝 꼬리까지 몽땅 내주는 더없이 거룩한 생 앞에 감히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이를 어쩌랴. 황소가 사라졌단다. 멀리 지나가는 암소를 보며 질러대던 황소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러고 보니 황소라는 이름도 사라졌다. 다만 종자번식을 위한 몇 마리 수소가 존재할 따름이다. 이제 고깃값이 좋은 수입 씨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소들은 이름만 수소이지 사실상 수소가 아닌 거세된 수소들이란다. 그러니 지금의 수소는 암소를 봐도 그저 침만 흘려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마치 오늘날의 볼품없는 사나이들처럼 말이다.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라고 읊었던 정지용 시인의 그 ‘ 얼룩배기 황소’는 이제 아련한 추억이다. 세상일은 늘 강물처럼 앞으로 흘러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