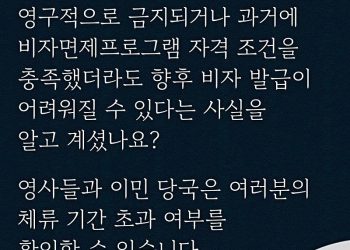한국 골프선수 중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는 임성재(26)다. 2019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신인왕을 차지했고, 처음 출전한 2020년 마스터스에서 준우승했다. 마스터스를 개막을 앞두고 8일 애틀랜타의 자택에서 임성재를 인터뷰했다. 마스터스 경험과 오거스타 내셔널 코스에 관해 얘기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졌다.
마스터스라고 하면 아직도 설레나.
“아직도 대회를 앞두면 기분이 새롭다. 어거스타를 ‘깃발 꽂힌 천국’이라고 하던데 맞는 것 같다.”
골프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뭔가.
“입구인 매그놀리아 레인으로 들어갈 때 찡한 느낌이 든다. 연습 그린에 있다가 1번 홀 티잉그라운드로 걸어갈 때도 그렇다. 다른 곳에서는 갤러리가 떠들기도 하는데 어거스타의 갤러리는 진지하다. 다들 존경심으로 대회를 관람하는 느낌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동반자는 누군가.
“타이거 (우즈)다. 우즈와 연습라운드도 함께 해보지 못했는데, 재작년(2023년)에 처음으로 같이 라운드했다. 우즈는 다리가 아파서 8개 홀만 치고 기권했다. 비도 오고 추웠는데, 아주 아파 보였다. 그래도 악수하고 같이 걸어 다닌 것 자체가 좋았다. 함께 경기할 때 다행히 잘 쳐서 좋은 인상을 준 것 같다.”
 임성재는 집에 헬스 기구를 구비하고 운동한다. 성호준 기자
임성재는 집에 헬스 기구를 구비하고 운동한다. 성호준 기자
6년 연속 출전인데 가장 좋은 추억은.
“당연히 2020년의 공동 2등이다. PGA 첫 우승보다 더 기억난다. 내가 마스터스에서 2등 했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베테랑이 유리한 마스터스에서 신인이 어떻게 그런 성적을 냈을까.
“그해 가을 퍼팅이 너무 안 됐다. 최악이었다. 마스터스를 앞두고 일주일간 경기를 쉬면서 하루 3시간씩 퍼트 연습을 했다. 그랬더니 어거스타에서 실수가 없어졌다. 3m 안쪽 퍼트가 다 들어가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쇼트게임은 내 인생 통틀어서 (그때가) 제일 좋았다. 예술이었다. 그린 밖에서 들어간 게 세 번 정도다.”
일반인은 갈 수 없는 아멘 코너 12번 홀 그린과 13번 홀 티잉그라운드 쪽 느낌은 어떤가.
“12번 홀 그린으로 가는 호건의 다리를 건널 때는 골프 성지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 코스 18번 홀 스윌컨 다리를 건널 때처럼 특별한 곳으로 간다는, 아무나 못 가는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는 느낌이 든다.”
어거스타는 다른 골프장과 뭐가 다른가.
“1번부터 18번까지 다 개성이 있다. 비슷한 홀이 없어서 매 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 12번 홀은 뭔가 특별해 보이고, 우즈가 그린 뒤에서 기역(ㄱ) 자로 꺾이는 칩샷을 넣은 16번 홀(파3)도 아름답다.”
안 좋은 기억의 홀은.
“2021년 15번 홀에서 9타를 쳤다. 잘 치다가 2온을 노린 샷이 그린을 넘어갔다. 내리막 칩샷을 남겼는데, 동반자 패트릭 캔틀레이는 비슷한 자리에서 아예 짧게 쳐서 잘라 갔다. 칩샷을 잘하고 자신도 있어서 과감히 쳤다.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홀 옆에 멈추는 것 같더니 슬금슬금 굴러 결국 빠졌다. 한 번 더 빠졌고, 그때 좀 아주 아팠다.”
 임성재 부부가 2023년 결혼식에서 쓴 캐디빕.
임성재 부부가 2023년 결혼식에서 쓴 캐디빕.
각 홀은 어떻게 공략해야 하나.
“파5 홀에선 점수를 줄여야 한다. 2번 홀은 우측 벙커 왼쪽 끝을 보고 살짝 드로를 걸어 티샷하면 하이브리드로 투온이 된다. 8번 홀은 두 번째 샷을 왼쪽으로 돌려쳐 그린 오른쪽으로 보내면 버디를 할 수 있다. 13번 홀에선 점수를 꼭 줄여야 한다. 그린 주변이 개울과 벙커, 화단 등으로 위험하지만, 하이브리드 클럽 거리(215m)까지 걸리면 2온을 시도한다. 15번 홀은 연습라운드 때 그린이 얼마나 단단한지 체크한다. 그린이 빠르고 경사가 심해 오른쪽 그린 사이드 벙커로 그린을 공략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반면 파4 홀은 매우 어렵다. 핀이 어디 있든 그린 중앙을 공략해야 하는 홀이 있다. 1번, 5번, 10번 홀은 욕심을 부려 핀을 직접 보면 보기가 나오기 쉽다. 어려운 퍼트를 두 번 해야 하지만 파를 할 수 있다. 아멘코너 파3인 12번 홀은 오른쪽 핀일 때 바람에 밀려 물에 빠질 때가 많아 아예 가운데로 친다. 그린이 얇아 거리 컨트롤이 중요한데, 잘 쳐야 하고 바람도 생각대로 불어야 한다. 운이 필요하다.”
취재, 사진 /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sung.ho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