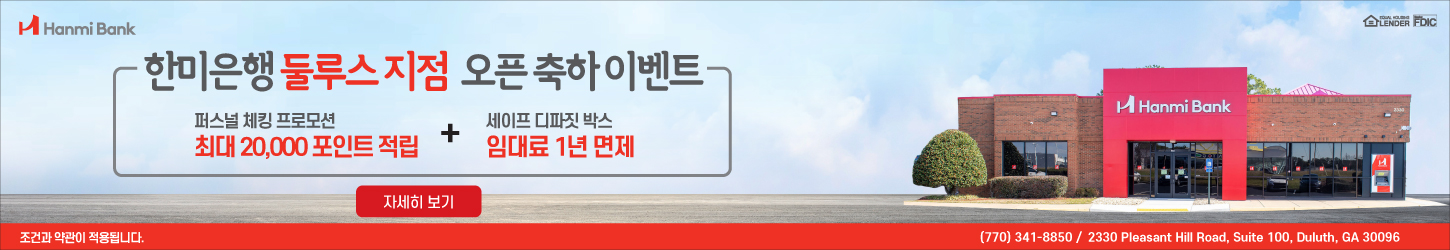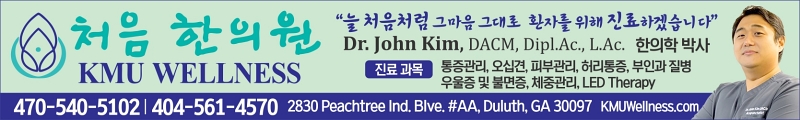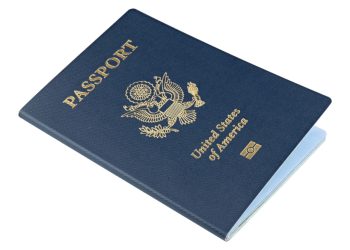400여년 전 스물일곱 해를 살다간 여인이 있다. 시인으로서 천품을 타고 났지만 ,감성이 너무 앞섰기에 오늘에야 빛을 발하고 있는 조선 중기의 여류 시인, 허난설헌(許蘭雪軒)이다. 당시 조선은 남자들의 세상이었다. 똑똑한 여인들은 세상에서 내쳐졌다. 조선은 허난설헌의 시재(詩才)를 불허했다. 시어머니는 학대했고 남편은 한눈을 팔았다. 아이 셋까지 다 잃었으니 ‘불행’이 울고 갈 삶이었다. 그 속에서 태어난 시가 처연하고 아름답다. 당시 조선의 여인들은 이름을 가질 수 없었고, 특히 ‘호(號)’를 갖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허난설헌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본명은 허초희((許楚姬))이고 난설헌(蘭雪軒)은 그의 호이다.
난설헌은 1563년(명종 18) 강릉 땅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천재의 재질과 유달리 아름다운 용모를 타고났다. 어린 나이부터 시를 잘 지어 ‘여신동’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남녀 차별이 심한 봉건제에서는 여자에게는 공부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달랐다. 아버지는 아들과 하나뿐인 외동딸 난설헌에게 똑같이 학문을 가르키고, 시를 짓게 하였다. 그 이유는 난설헌이 오빠들 어깨너머로 한자를 배웠는데, 한번 익힌 것은 결코 잊지 않았고 어려운 한학 서적을 거침없이 읽어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영차, 남쪽으로 대들보 올리세. 옥룡이 구슬 연못을 마시고 있네. 은평상에서 잠자다 꽃그늘 짙은 한 낮에 일어나, 미소로 요희를 부르며 푸른 적삼을 벗기네.’ 난설헌이 여덟 살 때 지은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의 한 대목이다. 상량문은 집을 짓기 위해 대들보를 올리며 행하는 상량식에서 상량을 축복하는 글이다. 동생 허균(홍길동전의 저자)은 글재주가 뛰어났는데, 어릴 적에 시를 써서 그 누님에게 보였다. 그 시의 내용에 “여인이 흔들어 그네를 밀어 보낸다”라는 시구를 보고, 난설헌이 말하기를 “잘 지었다. 다만 한 구가 잘못 되었구나” 하였다. 동생 균이 “어떤 어구가 잘못 되었는가”라고 물으니, 난설헌이 곧 붓을 끌어 쓰며 “문 앞에는 아직도 애간장을 태우는 사람이 있는데, 백마를 타고 황금채찍질 하면서 가버렸다”라고 고쳐주었다.
그녀는 열일곱 살에 안동 김씨 가문에 시집을 갔다. 그것은 그녀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고 굴레였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만 못하다는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잘해줄 리가 없다. 며느리를 구박했다. 집안일은 적당하게 하고 언제나 책상머리에 매달려 책을 읽거나 시를 짓는 며느리가 도무지 마땅치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용모가 한양에서 제일가는 미모라고 소문이 났지만, 남편은 아내보다는 다른 여인에 더 관심이 많았다. 난설헌은 이러한 부부 관계에 대한 슬픔이 많았다. 그래서 이를 시로 표현했다. “내게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있어 먼지를 털어내면 맑은 윤이 났었죠. 봉황새 한 쌍이 마주 보며 수 놓여 있어 여러 해 장롱 속에 간직하다가 오늘 아침 님에게 정표로 드립니다. 님의 바지 짓는 거야 아깝지 않지만, 다른 여인 치맛감으로 주지는 마셔요.”
남편과 금슬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자식을 먼저 저승에 보낸 비련의 어머니가 되었다.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올해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슬프고 슬픈 광릉 땅이여. 두 무덤이 마주 보고 있구나. 백양나무에는 으스스 바람이 일어나고 도깨비불은 숲속에서 번쩍인다. 지전으로 너의 혼을 부르고 너희 무덤에 술잔을 따르네.”그녀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강요당했던 만큼, 친정의 품격있는 분위기와 따스하게 감싸주던 친정 식구들을 더욱 그리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친정은 차츰 불행을 겪게 되었다. 수재인 그녀의 오빠들은 과거에 합격하여 각자 요직에 올랐지만, 정적들의 시샘을 받아 궁지에 몰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상주에서 객사했고 이어 오라버니는 율곡 이이의 잘못을 들어 탄핵했다가 갑산으로 귀양 가게 되었다. 난설헌은 이 암울한 현실을 초월해야만 했다.
그녀는 남존여비를 극복하고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자 시를 통해 저항하고자 했지만, 조선 사회의 강고한 벽은 넘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어느 날 붉은 연꽃 스물일곱 송이가 지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꿈에서 본 대로 스물일곱 나이에 그 꽃처럼 지고 만다. 난설헌은 스물일곱 되던 어느 봄날, 시 한 수를 남겨 놓고, 깨끗이 목욕을 한 후 손수 만든 선녀 옷을 입고 방안에 누워 호흡을 끊어 스스로의 생을 마감했다. 얼마나 한이 많았을까. 난설헌은 자신의 불행한 삶을 ‘삼한(三恨)’이라고 표현했다. 하나는 작은 나라에 태어난 것, 둘째는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난 것, 셋째는 능력과 인품을 제대로 갖춘 남편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요절했지만 그녀의 글들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녀가 쓴 시를 읽다 보면 웬지 모를 슬픔이 밀려 온다. “옛집은 대낮에도 인적 그치고/부엉이 혼자 뽕나무에서 울어라/섬돌 위엔 이끼만 끼어 푸르고/참새만 빈 다락으로 깃들고 있네/그 옛날 말과 수레 어디로 가고/지금은 여우 토끼 굴처럼 폐허 되었네/이제야 선각자 말씀 알겠구려/부귀는 내가 구할 바 아니라는 것을.” 허난설헌의 ‘감우(感遇)’다. 400여년 늦게 태어났다면 그녀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 만약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괜찮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