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1000만불 추가로 들어
카운티·후보·유권자 모두에 부담
6일 실시된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 결과가 미국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의 결선투표제는 분리주의자들이 1960년대 흑인 보팅 파워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워싱턴 포스트(WP)가 보도했다.
신문은 6일자 ‘조지아주 결선투표제는 흑인 투표권을 물타기 위해 만들어진 산물’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예비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택하는 주는 10개가 있지만 본선투표에서 결선제를 도입한 주는 루이지애나와 조지아주 2개주 뿐이다.
조지아의 결선투표제는 1964년 주 하원선거에서 패배한 분리주의자 덴마크 그루버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는데, 흑인의 정치적 대표성을 억압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었음을 본인도 인정했다.
애쉬튼 엘렛 조지아대(UGA) 역사학자는 “보수 백인이 선거 승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규정했다. 엘렛은 “당시에는 조기투표나 우편투표가 없을 때였고, 불공정하고 불법적, 비민주적 정책들이 많을 때여서 생활이 넉넉지 않은 주민들이 투표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도입된 지 58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진 라파엘 워녹 의원과 허쉘 워커 공화당 후보간의 이번 결선투표는 조지아 차원에서 치러지는 선거로는 12번째다.
최소 10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선거제도를 없애기 위해 유권자단체들이 노력해 왔지만 실패했다.
버나드 프라가 에모리대 정치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대선, 또는 중간선거 등 11월에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면 투표율이 낮고, 특히 소수계의 투표율은 훨씬 떨어진다”며 “다수가 소수계의 승리를 막을 수 있는 또다른 기회”라고 비판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투쟁으로 흑인에 대한 투표권 제한, 차별 정책들은 크게 개선됐다. 1960년대 29%에 불과했던 흑인 인구가 64년에는 44%로 늘어난 덕분이기도 하다.
1990년 결선투표제에 대해 연방 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한 스티븐 로슨 럿거스대 교수는 “백인, 남부 정치인들은 100년 동안 흑인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낸 다음, 최대한 눈에 보이지 않게, 투표하기 어렵도록 차별적 정책을 펴왔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 의해 인종과 관계 없이 평등하게 1인 1투표권이 부여된 것은 1963년. 1964년에 제정된 결선투표제는 1968년 주민투표를 통해 조지아주 헌법에 명문화됐다.
민권단체들은 결선투표제가 카운티, 선거운동, 흑인 유권자 모두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철폐를 주장했고, 1990년 연방 법무부와 미국 시민자유연맹도 흑인투표를 희석시킨다며 조지아주를 고소함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그루버가 인종차별주의자인 것은 맞지만 시스템에 대한 책임은 없다”며 이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1994년 주 의회는 결선투표 기준을 50%에서 45%로 낮추었으나 1996년 연방상원 선거에서 패배한 공화당이 2008년 기준을 다시 원위치 시켰다. 공화당은 또 본선거와 결선투표간의 기간을 9주에서 4주로 당겼다.
유권자 단체들은 대부분 결선투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른 주들처럼 최다 득표를 한 후보를 선출하면 되는 데, 불필요한 비용을 치러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유권자단체 케어 인 액션(Care in Action)의 힐러리 홀리 수석 디렉터는 “비효율적이고 재정 소모적인 이 제도는 그냥 없어지는 게 맞다” 고 주장했다.
김지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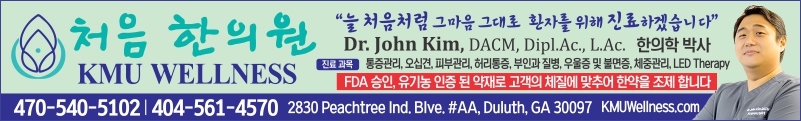





![4일(현지시간)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가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로이터]](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11/맘다니-350x2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