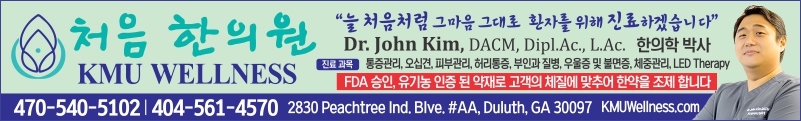1월이 다 갈 무렵, 아침에 산책하고 오는 길에 까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머리 위로 지나가더니 미국에 살고 있는 H장로님이 전화하셨다. 한국에 오셨단다. 흔한 까치가 모처럼 제 구실을 했다. 한국에 오고 나서 어쩌다 보니 연락을 못 드려 미안함이 있었는데 섭섭해 하지 않고 연락을 주신 것이 고마웠다.
장로님과 나는 어린 시절 살던 동네가 같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동네 이야기만 해도 잘 통해서 남다른 친근감이 있는 분이다. 솜씨 야무지고 멋쟁이인 권사님도 가까이 지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었다. 4, 5년 만에 만난 장로님과 권사님은 변하지 않았다. 오랜만의 만남은 반가움과 감격이었다.
우리에게 밀린 이야기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 쉽지 않은 한국 방문의 목적은 장로님과 권사님의 형제들이 연로해서 더 늦기 전에 만나 보려고 오셨다고 한다. 아마도 형제들과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다소 우울하지만 만남을 위해 먼 길을 온 두 분은 헤어짐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또한 주어진 만남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다 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
두 분은 오랜만에 온 한국이 매우 좋아졌다고 기뻐하셨다. 살기 좋아진 한국 이야기와 신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찌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설레던 만남의 시간은 금세 아쉬움을 안은 채 작별의 시간이 되고 말았다. 멀어져 가는 장로님 부부의 뒷모습을 보며 한국에 돌아오셔서 가까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2월에는 시애틀에서 친구 S가 귀국했다. 남편과 함께 12년 만에 귀국이었다. 타국 땅에서 삶의 기반을 다지느라 고국 방문을 뒤로 미루다 보니 훌쩍 십여 년이 지나간 것이다. 우리가 만나기로 한 카페가 붐빈다고 길에 나와 서 있는 S부부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보고 싶었던 사람이라 멀리 있어도 잘 보인다며 남편과 함께 뛰었고 S부부도 우리를 향해 달려와 서로 손을 잡고 펄쩍펄쩍 뛰었던 것 같다.
S를 시애틀에 찾아가 만난 것이 8, 9년전이었으니 정말 오랜만이었다. 우리 부부와 딸까지 시애틀 S의 집에서 머물면서 관광 안내까지 받으며 S와 그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쳤던 생각이 났다. S가 우리 만남의 시간도 짧은데 호텔에서 지내면 얼굴 볼 시간도 없다고 극구 말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 두고두고 미안하고 고맙다.
예쁘고 상냥한 S의 딸은 진심으로 우리를 반겨 주었고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주었다. 덕분에 시애틀은 우리에게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다. 그 딸이 결혼해 잘 살고 있고 아들네도 좋은 일이 있다는 기쁜 소식만 전해주어서 마음 놓고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다.
사람 좋은 S의 남편은 오랜만에 고국이 도리어 낯선 것 같았지만 S는 모든 것이 편리하고 좋아진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고 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애틀에 내린 뿌리도 꽤 깊어서 가능할 것 같지 않았다. 모처럼의 한국 방문이지만 편찮으신 어머니를 뵙기 위한 귀국이었으니 어머니만 뵙고 곧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집에도 와서 며칠 같이 지내고 싶었는데 섭섭했다. 이런 허무한 만남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깐처럼 지나간 세월은 치열했던 삶으로 가득 차 있고 이제 우리에게 모처럼의 한가로운 시간이 주어졌나 했더니 아직도 미션이 남아 있다. 은퇴 후의 삶은 여유롭고 한가하며 풍요로울 것이라고 상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나 보다. 우리는 왜 아직도 바쁘고 시간이 없는 걸까. 용기가 없어서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시간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원래 살아 있는 한 바빠야 하는 걸까, 알 수 없다. 기쁘고 들떴던 만남은 너무 짧았고 그래서 더욱 서운함과 아쉬운 이별로 끝났다. 우리는 과연 만난 것일까. 헤어진 것일까. 만남보다 헤어지는 순간의 기억이 더욱 선명한 까닭도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이별이 꼭 다음의 만남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지하철 안으로 사라지는 S부부의 뒷모습을 보며 그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주어진 시간을 보람 있게 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했다. 열차가 떠난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내게 남편이 말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만나서 너무 좋았어. 우린 또 만날 거야.” 남편의 예언이 적중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