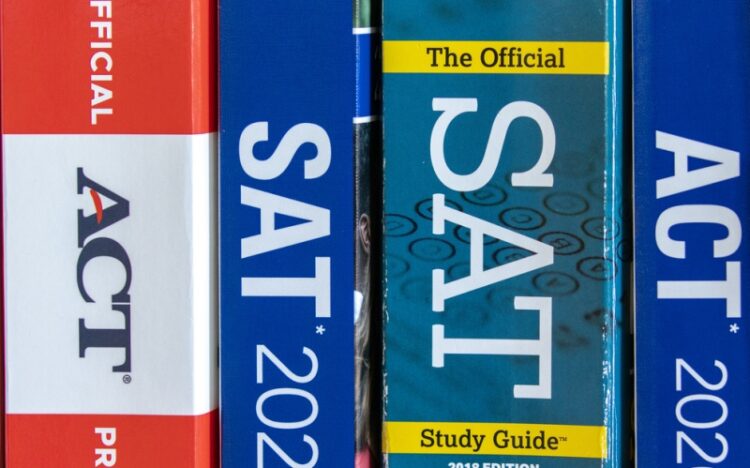대입자격 평가시험 SAT에서 고득점을 받은 학생 3명 중 1명은 경제력 상위 0.1% 가정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라지 체티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등이 2011년과 2013년, 2015년의 SAT 자료와 수험생 부모의 납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SAT에서 고득점의 기준이 되는 1300점 이상 받은 학생들의 가정을 소득별로 분류할 경우 상위 0.1% 가정 출신의 비율은 33%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하위 20% 가정 출신 학생이 전체 고득점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미국에서 경제력 상위 0.1%는 연 소득이 1130만 달러 이상이다.
또한 0.1% 가정 출신 학생만을 놓고 볼 때 SAT 1300점 이상을 기록한 학생의 비율은 38%였다.
연 소득 61만1000 달러 이상인 경제력 상위 1% 가정 출신 학생 중에서는 31%가 1300점 이상을 받았다.
이에 비해 경제력 하위 20% 가정 출신 학생 중 1300점을 넘긴 학생의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부유층 가정 자녀들이 유리한 교육환경 때문에 SAT 점수 등 학력이 높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존 프리드먼 브라운대 경제학 교수는 “상위 0.1% 가정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특수 사립학교와 세계여행, 대입 준비 교육 등 대학 학비보다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경제력 평가로 변질한 SAT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SAT 점수의 비중을 낮추고 자기소개서 등의 비중을 높일 경우에도 결국 SAT 고득점자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예 소득 수준에 따른 학력 차가 본격화하기 전인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