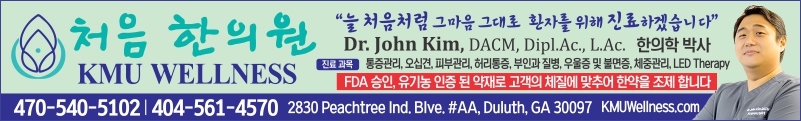나에게 갓씨가 조금 있다. 이 씨앗은 이웃집 여인이 나눠준 것이다. 여인은 씨앗에 담긴 그의 어머니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한국에서 오신 여인의 친정어머니는 그의 텃밭에 갓을 심으셨단다. 어머니는 갓을 솜씨 좋게 키우셨고 씨까지 받으셨다. 이 갓씨를 어머니는 딸에게 남겨주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다. 여인은 나에게 한번 심어보라며 솜털이 부숭부숭 붙어 있는 씨앗을 건네주었다.
이듬해 봄, 나는 상추씨를 뿌리면서 그 옆에 갓씨도 뿌렸다. 나는 무슨 일인지 갓씨를 쑥갓씨라고 찰떡같이 믿고 뿌렸다. 쑥갓은 상추와 잘 어울리는 쌈 채소이고 생선 찌개 비린내도 잡아주는 향기 좋고 부드러운 채소다. 그뿐 아니라 쑥갓을 살짝 데쳐서 된장에 무쳐도 정말 맛있다. 기억 속에 있는 온갖 좋은 쑥갓 맛을 상상하며 즐겁게 씨를 뿌렸다. 그런데 잘 자라는 상추와는 달리 시간이 한참 지나도 쑥갓씨를 뿌린 쪽에서는 싹이 보이질 않았다. 결국, 그해 봄에 나는 쑥갓을 만나지 못했다. 내가 어설픈 일꾼이라 씨앗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 씨앗의 생명이 한 해뿐인지도 모르겠다고 짐작했다.
어느 날 여인은 나를 초대하여 향과 맛을 첨가한 그만의 커피와 수제 치즈케이크를 내놓았다. 우리는 점잖게 수다를 떨었다. 수다 속에 싹 트지 않은 쑥갓씨 이야기도 걸려 나왔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되었다. 내 맘대로 갓씨를 쑥갓씨로 착각했다는 것을. 그래도 그렇지, 씨가 발아조차 안 된 것은 의문으로 남았다. 여인의 어머니 이야기는 기억하면서 쑥갓 먹을 생각에 씨앗의 이름을 바꾸다니 참 어이가 없었다. 앞으로는 나의 식욕이 기억을 조작하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씨앗 봉투에 ‘갓’이라고 분명하게 적어 놓았다. 그해 봄에 뿌리고 남은 갓 씨는 나의 씨앗 서랍에서 그렇게 2년쯤 잠들어 있었다.
올해 9월 초순, 여름내 깻잎을 내어주던 들깨를 뽑아내고 흙에 퇴비를 넉넉히 섞은 다음 갓씨를 뿌렸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갓씨를 뿌려보았다. 봄에는 갓 키우기에 실패했지만, 가을에는 성공할지 궁금했다. 혹시, 아주 혹시라도 갓이 자라준다면 갓김치 담그기를 시도해보리라. 나는 놀이터에서 물놀이하듯 텃밭 여기저기에 물을 주었다. 나는 체력 단련장에서 운동하듯 잡초를 뽑으며 허리를 구푸렸다 폈다를 반복했다. 그리고 배움터에서 지식과 깨달음을 얻듯 식물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인터넷을 기웃거렸다.
씨를 뿌린 지 보름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갓이 드디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갓, 너 살아 있었구나! 갓의 어린 잎은 여리여리 보라색이었다가 자라면서 자주색으로 짙어졌다. 잎사귀도 시원스럽게 넓어졌다. 어찌나 싱싱해 보이던지 쌈을 싸 먹으면 좋을 것 같았다. 이파리를 몇 개 뜯었다. 줄기에 잔가시가 있어 손에 거슬리기는 했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텃밭에서 막 가져온 자색 갓은 아삭하고 톡 쏘는 매콤한 맛이 났다. 아주 신선하고 매력이 넘쳤다. 겨잣과에 속하는 식물이라서 겨자채와 비슷한 맛이 났다.
남편과 나는 별 반찬이 없어 밥상이 심심한 날에는 갓을 몇 장 뜯어 왔다. 거기다 쌈장과 밥을 얹어 입안 가득 물고는 ‘음~, 음~’ 감탄사를 날렸다. 떡볶이에도 파와 함께 갓을 잘라 넣었더니 나름 잘 어울렸다. 우리는 갓이 온전히 자랄 틈을 주지 않고 뜯어다 먹었다. 갓김치는 담그기는 이다음으로 미뤄두었다. 나는 예쁘게 생긴 갓잎을 몇 장 거두어 갓씨를 나눠준 이웃집 여인에게 주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씨에서 나온 갓이라고 알려주었다. 건강한 음식을 좋아하는 그는 오늘 저녁은 고기를 구워야겠다며 좋아했다.
씨앗은 그 작은 공간에 생명을 담고 있다가 적당한 환경에서 생명을 이어간다. 씨앗은 사람에 대한 편견도 없다. 여인의 어머니 손에서도 잘 자랐고 내 손에서도 자라주었다. 씨앗은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만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다. 씨앗은 천천히 느긋하게 기다리는 기쁨을 선사한다. 씨앗에서 다시 씨앗을 얻기까지 긴 호흡을 요구한다. 이제 갓씨가 아주 조금 남았다. 갓들아, 그저 살아서 씨를 좀 남겨주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