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길 걷고 나면 10kg 정도는 살이 빠지지
마음속 독기도 함께 빠지고 그다음엔 평화“
연주로, 박수로, 경적으로 “환영, 환영”
기도로 함성으로 “잘 했어” 서로 격려
# 30일째
오늘은 19km를 걷는 날. 일기예보를 보니 8시부터 비가 잔다. 8시에 출발했다. 이렇게 늦게 길을 떠나기는 처음이다. 거의 마지막 길. 마치 과자를 아껴 먹듯, 천천히 음미하면서 길을 걷는다.
비는 오락가락, 바람은 차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쉽다. 이 길이 내일로 끝난다는 것이 안타깝다. 하나라도 더 담겠다는 듯이 천천히 걷는다. 그림같은 마을, 고색창연한 성당, 마음 숙연하게 만드는 묘지들을 지난다. 순례자의 신발에다 꽃을 기르는 집도 지난다.
 순례자들이 신었던 신발을 모아 꽃을 기르는 집
순례자들이 신었던 신발을 모아 꽃을 기르는 집
중간에 안나를 만났다. 지금은 이집트에 살지만 독일 출신의 영국인. 이번 카미노가 3번째다.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녀의 대답이다. “송, 카미노를 하고 나면 몸무게가 10kg 정도 빠져.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독기도 빠져.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평화가 오는지 몰라.”
19km가 이렇게 짧았던가. 1시가 되지 못해서 알베르게에 도착했다. 이렇게 오늘이 끝났고, 이제 최종 목적지 콤포스텔라 성당을 19km 남겨놓았다. 내일 오전이면 끝나겠다. 음- 뭐라고 해야 하나? 지금의 심정을.
오래전, 기억에도 아득한 군대 훈련병 시절이었다. 각개전투 때, 마지막 돌격선에 도착했다. 숨이 턱까지 찾다. 헉헉거리며 다음 명령을 기다린다. “착검-” 하는 명령이 떨어졌다. 총에 검을 꽂았다. “수류탄 투척 준비-” 가슴에 단 모의 수류탄을 손에 쥐었다.
이제 “돌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지면, 수류탄을 집어 던지고, 함성을 지르면서 돌격, 위에 있는 가상군 허수아비하고 백병전을 치르고 고지를 점령하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 마지막 순간! 숨을 고르면서 아래를 보았다. 저 멀리 강이 보였다. 금호강 줄기였다. 그때가 1979년 1월, 달구벌은 엄청 추웠다. 강이 얼어 반짝였다. 반짝이는 그 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나도 모르게 나온 말, “아름다워라!”
나는 그때를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내 심정이 그때와 같다. 마지막 돌격선에서 있다. 19km 밖에 있는 콤포스텔라 성당을 향하여. 뒤돌아본다, 여태까지 걸었던 길을. 아름다웠다. 누가 뭐래도 이 길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이 길을 걸었던 나는 내내 행복했다.
# 31일째
마지막 날이다. 첫날이라 생각하고 일찍 나섰다. 남들은 자고 있는데, 소리 없이 준비해서 소리 없이 알베르게를 나왔다. 카미노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전화기 불빛으로 신호를 찾고 앱으로 확인해서 더듬더듬 길을 간다. 처음 시작하는 기분이다.
안개가 짙어진다. 길은 더욱 신비해진다. 표지석을 지날 때마다 거리가 줄어든다. 13km, 9km, 6km…
순례자들이 점점 많아진다. 지나가면서 콤포스텔라 성당 앞에서 만나자 한다. 거의 다 왔나 보다. 길목에서 백파이프를 불어준다. 색깔을 입힌 종이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쓴 표지가 나온다.
 산티아고 입구, 한 연주자가 백파이프를 불어주며 순례자들을 환영한다.
산티아고 입구, 한 연주자가 백파이프를 불어주며 순례자들을 환영한다.
 이 고개를 넘으면 산티아고다. 순례자들이 많아졌다.
이 고개를 넘으면 산티아고다. 순례자들이 많아졌다.
드디어 산티아고, 산티아고에 들어왔다. 여기서 콤포스텔라 성당까지는 45분. 도상의 시민들은 계속 방향을 가르쳐주고, 지나가는 차들은 경적을 울려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유적이다. 고색창연한 성당이 엄청난 위용으로 순례자들을 맞는다.
마침내 콤포스텔라 성당이 보인다. 성당 옆을 끼고 도니, 큰 광장이 보이고 성당 정면이 나타난다. 여기다, 여기야! 드디어 도착했다.
 광장에서 바라본 콤포스텔라 성당
광장에서 바라본 콤포스텔라 성당
광장 한복판에 배낭을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는다. 배낭을 베개 삼아 눕는다. 하늘이 보인다. 비를 가득 품은 구름이 보이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보인다. 주변을 본다. 다들 도착하는 대로 배낭을 베개 삼아 누워서 하늘을 본다. 무슨 생각을 할까? 저 멀리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가족이 보인다. 뭐라고 기도할까? 함성을 지르면서 뛰고 있는 순례자도 있다.
그동안 안면이 있던 순례자들을 만난다. 이미 온 순례자도 있고, 계속 들어오는 순례자도 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반가운지. 펄쩍펄쩍 뛴다. 붙들고 운다. 서로들 묻는다.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프랑스 길이나, 카미노의 다른 길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위로 아닌 위로로 헤어짐을 달랜다.
 드디어 산티아고에 도착했다. 정확한 이름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다.
드디어 산티아고에 도착했다. 정확한 이름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다.
이제 혼자다. 성당 구석 기둥에 기대어 서 있다. 계속해서 순례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뒤돌아본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 무엇을 얻고자 함도 아니요, 무엇을 이루고자 함도 아니었다. 그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걷고 싶었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면서 걷고 싶었을 뿐이었다.
 산티아고 순례자 여권. 걸어온 거리만큼 도장이 가득하다.
산티아고 순례자 여권. 걸어온 거리만큼 도장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러나 카미노는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길을 보여주었다. 평생을 몸부림쳤던 길! ‘그’에게 이르는 길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침묵이었다. 그렇다! 죄 속에서 태어나, 죄 속에서 살다가, 죄로 가는 나.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오로지 긍휼과 자비를 힘입은 침묵뿐! 긍휼과 자비는 ‘그’가 하는 것이고 침묵은 내가 하는 것!
눈물이 쏟아진다, 심한 눈물이. 눈물이 속된지 모를 양이면 주저앉아 통곡하리라. 바람이 불어온다. 콤포스텔라 이 성당에 바람이 불어온다. 아스라한 바람이-. 〈끝〉
글·사진=송희섭 애틀랜타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은퇴목사
송 목사,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애독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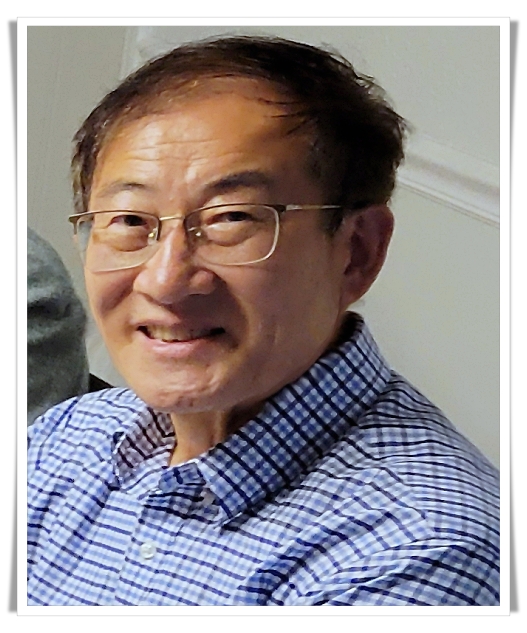
지난 4개월간 연재했던 카미노 시리즈가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연재하면서 카미노 길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다음에 함께 갈 수 있겠느냐고,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는 부탁도 많았는데, 되도록 혼자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길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거룩한 길입니다. 여자 혼자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특히 프랑스 길은 숙박시설, 길 표시 등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알베르게에 들어가도 우수한 성능의 와이파이(Wi-Fi)를 제공합니다.
혹 걷다가 힘이 들면 중간 중간에 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짐(배낭)을 다음 알베르게까지 수송해주는 시스템도 있고요.
이 길을 걸으시길 권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힘은 덜 들고, 깨달음은 더합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을 추구했던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카미노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벌써 카미노가 그립습니다. 해서 내년 봄, 부활절 후, 포르투갈 길을 걸으려 합니다. 포르투갈의 봄길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송목사,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걷다’를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리즈를 기획하고 소중한 지면을 할애해 준 애틀랜타중앙일보에 감사드립니다. 송희섭 목사





![[송 목사,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16. 한 달 걷고 얻은 것](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4/05/QQKakaoTalk_20240501_135333713_05-750x42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