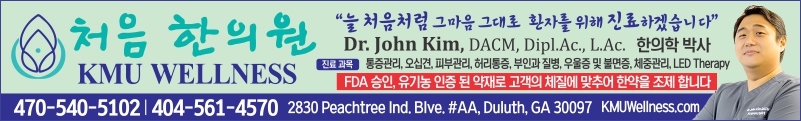요즘 인터넷에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오만가지 동영상이 홍수처럼 범람한다. 특히 “노년의 시기에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며 종교인, 심리학자, 철학자, 교수 그리고 무술인까지도 온갖 충고를 쏟아낸다.
이중엔 삶의 지혜가 무르익은 김형석 교수, 이시형 박사 같은 분도 계시다. 하지만 난 지금까지 지혜를 쌓아가는 게 수월치 않아 동서고금 성현들의 책을 펼쳐보고 있다.
수년 전 읽은 책으로 나도 노년은 꼭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책이 있다. 메흐틸트 그로스먼과 도로테아 바그너가 쓴, ‘늦게라도 시작하는 게 훨씬 낫지’라는 제목의 책이다. 학창 시절엔 배우를 꿈꿨지만,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독일인 할머니 메흐틸트와 그의 손녀, 도로테아와의 대담이 기록된 책이다.
메흐틸트는 내가 태어난 1939년에 출생해 전후 세계를 궁핍 속에 살아오며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는 지금 80대를 풍족하게 살아가면서 “인생 최고의 시기는 노년에 끝나지 않는다! 어쩌면 노년은 단지 시작일지 모른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는 80을 넘긴 지금에도 눈을 감으면 젊었다고 느껴진단다. 사실 몸의 허약함으로 인해 모든 활동의 제약을 받으며 주위의 지인들이 하나하나 떠나가니 노년엔 누구에게나 괴로움과 외로움의 감정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메흐틸트는 늙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명의 이기인 세척기 사용하기, 온라인으로 물품 구매하기 등을 손녀에게서 배우며 삶의 재미를 더해간다. 평생을 같이하고 사랑했던 남편도 치매로 떠나보내고, 이제는 아무 의무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을 찾으며 자기 취향대로 하루를 지낸다.
새벽 4~5시에 잠이 깨면 책을 읽고 좋아하는 커피를 마신다. 때론 침실에 햇빛이 가득찰 때까지 늦잠을 자며 아무 약속도 없는 조용한 하루를 즐기며 행복해한다.
젊어서는 돈도 부족하고 많은 것을 참고 살아야 했지만, 노후엔 자신을 대접해 주고 싶다며 좋아하는 포도주와 산양 치즈도 냉장고에 갖춰 놓는다. 가끔 케이크,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을 찾기도 한다.
집에서 홀로 묵묵히 앉아 삶의 최후를 맞기 싫어 봉사 활동도 하고 음악 콘서트에 같이 갈 남성을 찾아보기도 한다. 손자 손녀에게 유산을 조금씩은 남기겠지만 전부터 벼르던 이탈리아, 스페인 방문과 먼 남미여행도 감행하며 자신을 위해 돈 쓰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메흐틸트가 보여주는 이러한 열린 사고방식에 동의하면서, 세상을 떠난 후 아이들이 자기를 떠올릴 때 항상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실컷 사랑을 베풀고 싶다는 소망에 박수를 보낸다.
파스칼은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고, 죽음의 시기보다 불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했다.
뜻밖의 사건이 나에게도 찾아왔다. 80세 되던 해에 폐암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나는 수술 바로 전 해에도 마라톤을 완주했고 수술 일주일 전에는 10Km 경기에 출전해 신나게 달리기도 했다. 갑자기 찾아온 수술로 나의 생활 방식이 180도 달라졌고 하루아침에 늙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요즘은 내가 받은 폐암 수술에 오히려 감사하며 지낸다. 달리기를 접으며 산책에 눈을 떴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자연과는 친구가 되었다.
아침마다 걷는 동네 호숫가에서 나무와 새들과 철 따라 피고 지는 무수한 꽃들을 만난다. 호수에는 오리 가족이 나를 반겨주고 어떤 날은 사슴을, 어떤 날엔 두루미와 백조를 만나게 된다. 백조를 만나는 날은 더없이 기분이 좋다.
백조는 노년의 나에게 자연인 박상설 선생님이 지어주신 별명이다. 아산병원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있는 나를 보시고 원래는 원님이나 선비를 생각하셨는데 나중에 백조로 바꾸셨다. 주말이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거나 혹한의 겨울에도 산행을 멈추지 않는 나의 야성적 취미를 읽으신 것이다.
하지만 수련의 시절부터 오래도록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나를 아인슈타인 또는 브라운 박사(영화 ‘Back to the Future’에 나오는 괴짜 발명가)로 불렀다. 나의 흰 머리 스타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방면에서 나의 기이하고 괴짜스런 행동이 아인슈타인이나 브라운 박사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별명이 백조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의 취미 생활인 마라톤도 서서히 걷기로 바뀌었다. 이젠 나의 생활에서 활동적이고 야수적인 취기는 거의 사라지고 자신의 내면과 자연을 관조하는 생활만 남은 것 같다. 좋아하는 텃밭 가꾸기도 더욱더 소중한 일과로 비중이 커졌다.
내가 루소나 윌리엄 워즈워스 또는 소로와 같을 수는 없지만, 숲속을 걸으면서 나름대로 자연 속의 신비를 만끽한다. 때론 자연과 합일되는 성스러운 감정에 물들기도 한다. 야수의 심성으로 오직 속도에만 신경을 쓰며 동서양의 많은 숲속을 달리던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오늘도 고즈넉한 마음의 평화를 맛보며 숲에서 떠오르는 투명한 생각들을 시어(詩語)로 끌어 올리려 안간힘을 쓴다. 이젠 이게 내 행복이고 내 고민이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인생의 막바지에서 숲속의 자연 예찬, 텃밭의 생명 예찬에 푹 빠져 하루하루를 행복해한다. 김태형 /에모리대 의과대학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