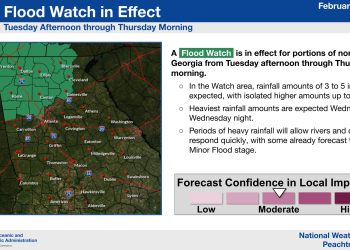고온 환경 노출로 열사병·탈진 등 발생
애틀랜타의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0~100도를 넘나들면서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폭염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겪는다. 열사병, 열탈진 등이 대표적 사례다.
15일 애틀랜타 저널(AJC)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2009~2022년 조지아 온열질환자 통계에 따르면, 14년간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3만 5000명에 달한다. 매년 2500명이 심한 열질환을 앓은 셈이다. 백인(55.7%)이 가장 많았으며 흑인(38%)이 뒤를 이었다. 흑인의 주 인구 비율이 31%임을 감안하면 흑인의 온열질환 발생률이 불균형적으로 높은 셈이다.
이중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05명이다. 지역별로 리치몬드, 채텀, 디캡, 캅 카운티가 모두 11명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풀턴(10명), 귀넷(8명), 머스코지(7명), 캐롤(7명) 카운티도 위험 지역이다.
최근 5년 부검보고서에 따르면 온열질환 사망 원인은 다양하다. 노숙인을 비롯해 길을 잃은 치매 환자, 야외 작업 중이던 노인, 차량에 방치된 아동 등이 열사병 사망자로 보고됐다. 이외 2019년 화씨 97도의 날씨에 야외 훈련을 하다 사망한 고등학교 농구선수 이마니 벨(16), 같은 해 9월 창고 정리 후 낮잠을 자다 사망한 조나단 베슬리(33) 등도 부감 결과 열에 의한 심장 마비 판정을 받았다. 특히 베슬리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이주한 지 얼마되지 않아 조지아의 더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강도 신체활동을 했다는 점이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온열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방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2일 새로운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지아주 일부 지역은 대기온도와 습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체감온도(열지수) 측정 체계조차 없다. 브라이언 스톤 주니어 조지아텍 도시계획과 교수는 “대중에게 공개된 기상 데이터 관측소가 부족하다”며 “각 타운마다 최대 8도, 메트로 애틀랜타 전역에서 최대 20도까지도 기온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관측소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지구온난화가 현재 추세대로 지속된다면, 애틀랜타는 향후 15년 내에 평균 체감온도 87도를 기록하게 된다. 스톤 교수는 “87도는 젊고 건강한 성인이 1시간 야외활동 시 몸에서 열을 느끼는 수준”이라며 “3~4시간 동안 야외 햇빛에 노출되면 체온은 최대 104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자, 노인의 경우 바깥에 1시간 나가있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수준까지 기온이 높아지면 주택 건설은 물론 쓰레기 수거 작업도 어려워진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