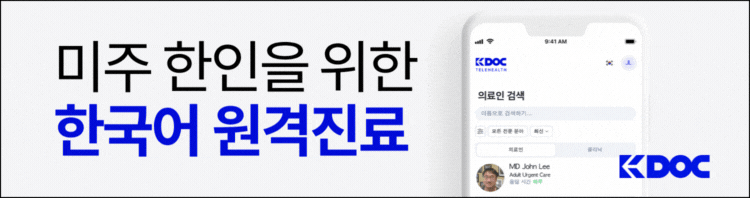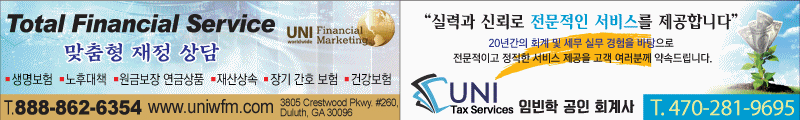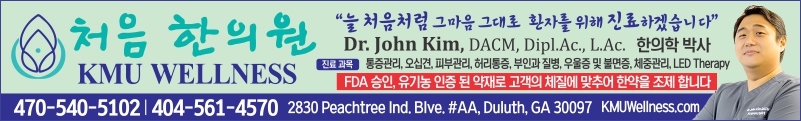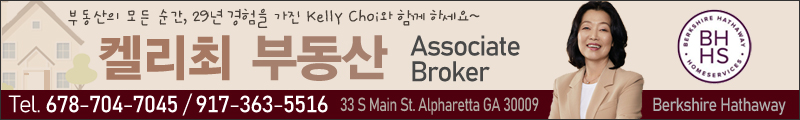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한다. 타지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도 반가운데 하물며 먼 이국땅에서 고국 사람을 만나면 그보다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중국의 장쑤성(江蘇省) 양저우(揚州)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주와 같은 고도(古都)로 남쪽으로는 장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성도인 난징과 붙어 있다. 당나라 때는 물길을 통해 수도 장안에 강남의 물자를 공급하는 수륙교통의 요충지로 역사적으로 신라와 고려인의 왕래가 많았고, 아라비아인, 일본인, 페르시아인, 동남아인 등 세계 각국의 상인이 몰려들던 국제상업도시였다. 양저우는 당나라 때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인 ‘신라방'(新羅坊)이 설치됐던 곳이며 원나라 때 중국에 왔던 마르코 폴로는 이곳에서 3년간 정부 관리로 일했다고 한다.
국제상업도시이다 보니 음식문화도 발달했다. ‘양저우 차오판 (揚州炒飯)’은 전형적인 중국 볶음밥이다. 원래 양저우 볶음밥은 운하의 뱃사람들이 애용하던 저녁 한 끼 음식이었단다. 뱃사람들은 점심에 먹고 남긴 밥을 따뜻하게 데우려고 거기에 달걀과 다진 파, 갖은 조미료를 넣어 뜨거운 기름으로 볶았다. 남긴 밥을 따뜻하고 맛나게 먹기 위한 삶의 지혜가 응축된 요리가 바로 양저우 볶음밥이다. 천하의 사람과 물산이 양저우로 몰려들었던 것처럼 양저우 볶음밥에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다. 그래서 나온 말이 “산과 바다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으면 진짜 양저우 차오판이 아니다”라고 한다.
양저우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아주 각별한 도시다. 통일신라시대의 문장가 최치원. 천년하고도 한 세기 전에 살았던 최치원을 현세인이 기억하는 까닭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우선 열두 살 때 당나라에 건너가 6년 만인 열여덟 살 때 빈공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것을 그 하나로 꼽을 만하다. 중국에서는 최치원을 동방 문학의 시조로 치고, 그의 저서인 〈계원필경〉을 동방 최고 문집으로 인정하고 있다. 당나라에 최치원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875년 정치 혼란 속에서 일어난 ‘황소의 난’때였다. 당시 화남절도사 고변의 종사관이었던 최치원은 당의 수도 장안까지 점령한 황소를 꾸짖는 격문인 ‘토황소격문’을 지었다. 그 논조가 얼마나 준엄했던지 반란 수괴가 이 글을 읽다가 놀라 침상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햇볕이 활짝 퍼졌으니 어찌 요망한 기운을 그대로 두겠으며, 하늘의 그물이 높이 쳐졌으니 반드시 흉악한 족속을 제거할 것이다. 너는 평민 출신으로 농촌에서 일어나 불지르고 겁탈하는 것을 좋은 계책으로 알고 살상하는 것을 급선무로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는 큰 죄만 있고 속죄할 수 있는 작은 착함도 없다.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너를 드러내놓고 죽이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또한 땅속의 귀신들도 이미 너를 죽이려고 의논하였을 것이니 비록 네가 목숨이 붙어있어 혼이 있다고 하지만, 벌써 정신은 달아났을 것이다. 무릇 사람의 일이란 스스로 아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게 아니니 너는 살펴서 잘 들어라. 만일 미쳐서 날뛰는 도당들에게 끌리어 취한 잠을 깨지 못하고 범아재비가 수레에 항거하듯이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다가는 우리 군사가 한번 쳐부수어 까마귀와 솔개 같이 날뛰던 무리가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갈 것이다. 너의 몸뚱이는 도끼날에 기름이 되고 뼈는 전차 밑에서 가루가 될 것이며, 처자는 잡혀 죽고 종족은 주살될 것이다. 너는 모름지기 진퇴를 헤아려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최치원은 생전에 고국인 신라보다 중국에서 더 실력을 인정받았고, 사후에도 오히려 중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양저우시는 2007년 중국 외교부의 비준을 받아 당성(唐城) 유적지 안에 최치원기념관을 개관했다. 입구 안내판에는‘중국에서 첫번 째로 세워진 외국인 기념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기념관에는 조각상과 함께 그의 삶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당성 유적지는 수양제의 행궁과 당나라 회남절도사 관아가 있던 곳으로, 당나라 고성이 드물게 잘 보존된 곳으로 꼽힌다. 최치원이 회남절도사 고변의 종사관으로 약 5년간 근무한 바로 그 자리다. 이런 중요한 유적지를 외국인의 기념관으로 조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름을 떨치던 당나라이지만, 여기서 뼈를 묻을 수는 없었다. 최치원은 그가 연마한 학문과 경륜을 조국인 신라에 바치고자 고국을 떠난지 18년만에 귀국한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골품제라는 철옹성이 버티고 있었으니,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성골과 진골세력이었다. 더하여 오래지 않아 당의 혼란이 동쪽으로 번져온 듯 진성여왕의 실정과 함께 도처에서 일어난 반란이 들불처럼 번졌다. 이에 ‘시무십여조(時務十餘條)’ 국정쇄신책을 올렸으나 왕도 제어할 수 없는 귀족세력의 벽에 막혀 시행되지 못했다. 그는 마침내 관직을 버리고 천하를 주유하며 후세를 위해 반석에 글을 남기다 가야산에 은거했다. 가야산 홍류동 계곡은 가야산 19경 절경이 펼쳐진 곳으로 그가 속세와 단절하고 자연을 즐기며 말년을 보낸 곳이다. 처자를 거느리고 가야산에 입산하는 도중 한 노승이 산 문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남긴 입산시는 속세에 더 이상 미련 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스님이여! 산이 좋다고 말하지 마소/산이 좋다면서 왜 다시 산을 나오시나/뒷날 내 자취를 두고 보시오/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을 테니.”
시처럼 그는 끝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그가 언제 죽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사람들은 그가 신선이 되었다고 믿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6월 27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확대 회담 환영사에서 최치원의 한시 ‘‘범해(泛海)’’를 인용해 천년 전 최치원과의 인연을 불러냈다. 그는 최치원이 중국에서 공부하고 돌아갈 때 ‘돛달아 바다에 배 띄우니 긴 바람 만리에 나아가네…’란 시를 썼다고 상기시켜 주었다. 한중 교류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