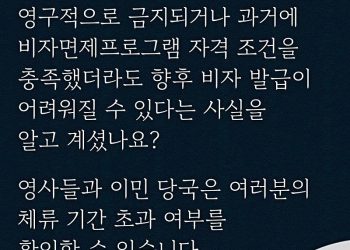8월은 광복의 달이다. ‘광복’이라는 단어는 빛을 되찾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스스로 다스리는 국가로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날이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이룩한 자유와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자,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날이다. 지난 15일, MDC사랑복지센터는 마가렛 김 사장을 비롯하여 전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광복 79주년 기념식을 갖고 선열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다.
‘사랑TV’신상훈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회원들은 손수 만든 종이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와 광복절 노래를 힘차게 불렀다. 얼마 만에 불러보는 광복절 노래인가.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 하리/이 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첫 소절부터 감동적이다. 우리 조국의 땅을 만져보자고 한다. 바닷물도 덩실덩실 넘실넘실 춤을 춘다. 가슴이 뭉클하다. 어린 나이에 일본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김 장로님은 만세삼창을 하다가 감정이 북바쳐 오열하는 바람에 장내가 숙연해졌다.
8월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이 또 하나 있다.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가. 국치일이다. 8월이 오면, 광복절은 생각하지만, 국치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 그럴까. 부끄럽기 때문에, 내보이고 싶지 않은 치부이기 때문일 것이다. 먼지를 털고 국치일을 역사의 창고에서 불러내야 한다. 와신상담. 1년에 한 번이라도 쓰디쓴 쓸개를 꺼내어 핥아 보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 된 도리다.
1910년 7월 23일 신임 통감 데라우치와 총리대신 이완용은 한일합방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8월 16일 데라우치 통감은 이완용에게 합방조약안을 내밀고 수락을 독촉했다. 이틀 후 각의가 열리고 22일에는 어전회의가 열렸다. 그날 이완용과 데라우치는 합방조약에 조인했다. 일주일 후 마지막 황제 순종은 대한제국과 일본의 합방조약을 발표했다. 그날 한국 정부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 양여할 것을 규정한 합방조약에 따라 조선왕조는 27대 519년 만에 막을 내렸다. 한국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데라우치는 이날 자신의 일기에서 이때의 소회를 이렇게 적었다. (1910년 8월 22일) “오후 4시, 한국 합병의 조약을 통감 관저에서 조인하여 마쳤다. 합병문제는 이와 같이 용이하게 조인을 끝냈다. 하하하!”
원래 이토 히로부미가 작성해온 을사늑약은 4개조 뿐이었다. 조약안을 내밀자 고종은 대신들에게 떠넘겼고, 대신들은 황실의 안녕을 보장하는 조항을 넣자고 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자리에서 제 5조에 “일본은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 유지를 보증한다”는 내용을 써넣었다. 주권을 빼앗겨도 황실만 보호하면 된다는 태도였다. 병합조약도 마찬가지다. 8개 조 중 제1조와 2조는 한국 황제는 한국에 관한 통치권을 양여한다는 것과 일본 황제는 양여를 수락한다는 내용이고, 제 8조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는 조항이다.
나머지 5개 조항은 무엇 무엇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즉, 황제 태황제 황태자를 비롯한 황실과 황족, 그리고 공훈이 있는 자 등에게 그 직위에 맞는 대우와 세비 및 은사금 지급 등을 약속한 내용이다. 일제는 약속을 지켰다. 순종 황제는 왕으로, 고종은 이태왕(李太王)으로 봉해졌고, 황실을 비롯하여 전현직 대신들 76명에게 작위를 수여하고 은사금도 지급했다. 또 나라가 망하기 3일 전인 1910년 8월 26일, 순종 황제는 이완용과 궁내부대신 민병석에게 대한제국 최고훈장인 금척대수훈장을 수여했다. 또 황후 윤 씨는 황실 및 종친, 이완용의 부인 등 40여명에게 서봉훈장을 수여했다. 500년 사직이 망하는 마지막 순간, 군주와 대신들은 나라를 넘겨준 공로로 훈장을 주고받은 것이다.
한일병합이 알려지자 망국의 치욕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가 적지 않았다. 전남 구례의 선비 매천 황현은 경술국치에 죽음으로 항거했다. “나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지만, 다만 국가나 선비를 기른지 500년이 되어 나라가 망하는 날 한 사람도 난국에 죽지 않는다면 오히려 애통하지 않겠는가.” 황현은 유서와 절명시 네 수를 남기고 아편덩이를 삼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절명시의 “이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되기는 어렵기만 하다”는 마지막 구절은 나라가 속절없이 무너진 상황에 부딪친 지식인의 아픔과 고뇌를 함축하고 있다.
많은 지사가 스스로 목숨을 버려 일제의 침략에 저항했다. 나라를 구하려고 목숨 바쳐 싸운 이들도 있었다. 일반 백성이었다. 이들은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항전했다. 이들은 근대식 무기를 가진 일본군과 싸워 이기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일제와 싸웠고, 수만 명이 죽었다. 조선이, 아니 대한제국이 왕의 나라라면 마땅히 임금과 그 일가가 망국의 책임과 죄업을 져야 할 것이로되 이 씨 성의 왕족 중에 스스로 책임을 다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을사년(1905) 이래 경술년(1910)을 지나면서 선비 등 많은 분들이 스스로 왕토에 사는 신민의 도리를 다했다.
한국인은 위기에 뭉치는 민족이라고 한다. 그렇다. 하지만 구한말 위기에서는 뭉치지 못했다. 그리고 나라를 잃었다. 조선의 멸망으로부터 고작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 실패를 반복하려 드는 것일까? 우리 시대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대체 무엇을 배운 걸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기뻐해야 할 광복절이 국론분열의 장으로 끝났다. 독립유공자들을 대표하는 광복회장이 정부 주관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항일운동에 나섰던 선조들은 갈갈이 찢어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참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