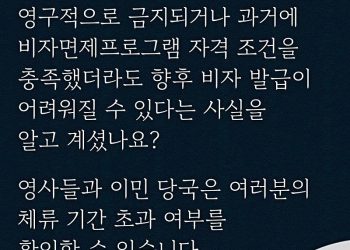편지라는 단어가 내게 오래된 향수처럼 다가왔다. 늦은 밤 조용히 편지를 쓰던 기억, 빨간 우체통에 편지를 넣던 손끝의 떨림, 우체부 아저씨가 들고 오는 답장을 기다리며 설렜던 시간들, 편지가 오가던 시절은 마치 문명이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처럼 아득히 멀게 느껴진다.
요즘 날씨가 추운 것도 있지만 몸이 불편한 이유로 바깥 출입을 거의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차분하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계획하며 준비를 할 여유가 많아졌다. 정성껏 그린 카드와 편지를 감사해야 할 지인들에게 쓰며 생각을 했다.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는 일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기억이 가물가물 했다. 지금처럼 메신저가 대신하기 이전에는 자주 편지를 썼다.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하장을 보내는 것도 연례행사였다. 친구나 편한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지만 연하장은 은사님이나 집안 어른들께 예의를 갖춰 보냈던 것 같다. 새해를 밝혀주는 해돋이 풍경, 소나무 위를 덮고 있는 흰 눈과 학, 복조리와 복주머니, 한복을 입고 세배하는 아이들의 고운 그림들. ‘근하신년’과 ‘송구영신’ 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박힌 카드들 속에는 늘 감사의 마음과 새해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
얼마 전 지인이 보내준 ‘우울한 샹송’ 이란 시를 읽다 노래가 떠올라 유튜브에서 찾아 들었다. “우체국에 가면 잃어버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 선율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들이 흘러나와 나를 끌었다. 빨간 우체통이 나의 편지를 반갑게 안아주던 어린시절 동네의 길목이 그려졌다. 집 현관문 구멍 사이로 우체부 아저씨가 넣어준 편지를 기다리던 설렘도 떠올랐다. 우체국 앞에 줄을 서서 우표를 사 모았던 우표첩이 아직 내 책장 한편에 있다. 빛 바랜 우표 위에 둥근 도장이 찍힌 편지들을 모아둔 박스는 오래된 앨범과 함께 벽장에서 잠을 자고 있다.
내가 처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강원도에서 부산으로 이사 오면서, 그곳에 남아 계신 작은아버지께 보내던 것이 시작이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강원도에 몇 년 근무할 때, 집주인 부부와 정이 깊어진 우리 가족은 그분을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라 부르며 잘 따랐다. 아이가 없던 그분들은 아버지가 월남전에 가셨던 기간에도 우리를 친자식처럼 아껴주며 잘 보살펴 주셨다.
내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월남전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마중하기 위해 작은아버지와 부산까지 내려왔던 날, 나는 혼자 과자를 사러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 울며 숙소를 찾아다니던 나를 어떤 아저씨가 파출소로 데려가주었고, 땀에 젖은 작은 아버지가 나를 찾아 안고 울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이사 온 뒤부터 나는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소식을 전하며 편지를 썼다. 그 편지는 어른이 되어서도 귀한 인연의 끈을 이어주었다. 항상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께로 시작한 편지를 보내면 어김없이 정성스럽게 답장을 보내주셨다. 작은아버지는 필체도 멋지었고 글솜씨도 좋으셨다. 내가 결혼한 후에도 작은아버지와 편지로 계속된 인연은 내 삶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고등학생 때는 친구들의 연애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했고, 라디오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 선물에 당첨되기도 했다. 남편과 연애할 때는 매주 그의 직장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냈다. 부서 동료들이 오히려 더 기다렸다던 그 편지는 남편과 나를 사랑으로 이어준 매개체가 되었다.
생각해 보면 편지는 내가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는 다리였다. 기다림이자 설렘이었고 행복이기도 했다. 지금도 빨간 우체통은 오랜 친구처럼 그 길목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며 삐삐와 휴대폰이 등장했고, 이제는 이메일과 메신저가 대세가 되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일이 더 익숙해진 요즘,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점점 잊혀가고 있다.
신년 카드를 쓰면서 나는 오랜만에 그 감정을 다시 느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쓴 글씨로 전해지는 마음이 얼마나 깊고 소중한지를. 누군가는 그 편지를 받아 들고 봄꽃처럼 화사한 햇살 속 설렘을 느낄 것이다. 손 편지가 사라져 가는 시대 속에서도 나는 빨간 우체통의 그 따스한 연결을 소중히 붙잡고 싶다.